어머니 마음

어머니는 잔잔하게 주름진 얼굴과 구부정한 허리춤, 절뚝 거리는 발걸음, "그려. 그렇지뭐. 아니면 말구." 하는 말솜씨. 참으로 현명하시다. 어디 다녀오시면 항시 두 손 가득 음식물을 들고 오셨다. 이는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
그러니 어쩌겠는가? 나 또한 어디 다녀오거나 가면 뭔가 들고 간다. 그나마 지갑을 떼어놓고 현금을 쓰지않고 명함도 사진을 찍어놓으니 스마트폰 1개면 다니기에 불편하지 않아서인지 점점 뭔가 들고다니는 것이 불편해졌음에도 뭔가 맛난 걸 보게 된다거나 하면 함께 먹을, 내가 준 것을 맛있어할 가족을 생각하면 기꺼이 서둔다. 며칠 전 달인 만두가 그러했고 앞서 여러 기억나는 일들 또한 그러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한다. 욕심이 없나 보다. 아니면 애써 내려놓았던가 잊었나 보다. 자주 다니는 마실이 좋고 그러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좋으신가 보다. 어제도 생신을 맞아 고기를 구워먹고 있단다. 생신축하 모임은 7월 7일을 앞둔 토요일에 하기로 했음에도 아쉬웠던지 옹기종기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때론 아쉽고 때론 미안하고 때론 감사하고 때론 부끄럽고 때론 기도하고 때론 반성하고 때론 보고싶다고 보고싶었다며 전화를 건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꾸리셨고 성당 앞에 둥지를 틀었다. 골목골목 거미줄처럼 이어진 마을길 삼거리의 정 중앙에 커다란 대문없는 문을 두고 치렁치렁 나팔꽃이 피었고 검은 그물망이 그늘을 만든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 집, 가운데 집, 오른쪽 집이 있었다. 우린 가운데 집에서 살았다. 마당엔 개들이 짖어대고 앞마당엔 언제라도 씻을 수 있는 터가 있었다. 계단을 오르면 현관이 있고 들어선 오른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굳건히 자리했다. 등목하던 때가 “어여 와~” 하며 부르시던 모습이 선하다.

아버지는 손수 한 장 한 장 나무를 얽히섥히 엮으면서 천장을 만드셨다. 그것이 내가 마주한 첫 인테리어 였다. 당시엔 아주 오래 걸렸었다고 기억난다. 휭한 구멍을 하나씩 메워나가다보니 어느 사이 나무결이 멋들어진 천장이 벽과 어울려 집이 완성되었다. 왼쪽 안방, 가운데 부엌, 오른쪽 끝방엔 할머니와 내가, 오른쪽 방, 이렇게 살았다.
내게 아버지는 목수요 베스트 드라이버이면서 닮고 싶은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구부정한 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정하셨다. 무척 챙겨주셨다. 아마 내게 남은 인정(사람됨, 서로간의 정)은 할머니께 배운, 녹아든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한다. 손 짓 하나하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묻어나는 그 정을 어찌 잊을까!
큰 누나는 커다랗다. 아빠와 엄마의 장점 만 받았는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한다. 그런데 대입은 너무 힘들었던 집안 사정에 경리일을 배웠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데 부끄러움에 멀리한다. 가장은 내가 아닌데...
작은 누나는 큰 누나 보다는 작지만 결코 작은 풍채가 아니다. 투포환을 던졌었고 만화책을 무척 좋아했으며 의욕이 넘쳤다. 뭘 해도 대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승부를 건다. 비교를 즐겨 한다. 마음이 따스한데 우월함이 배어있다.
나는 188에 94 이다. 많이 크다. 키다리 아저씨, 아낌없이 주는 나무, 플래툰(작은누나가 영화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처음 영화관에 데려가서 본 영화), 에이리언(한참 영화에 빠진 때 본 영화), 만화 같은 인생(만화책을 무척 좋아했다), 무협 같은 몽상(고교시절 빠져서 녹정기의 모험담과 연애를 경험했다), 스타크래프트(대학시절 면허시험 만큼이나 집중했던, 결혼초기 이 때문에 갈등이 심했고 결국 중단했다), 한미태극기, 오징어, 구슬치기, 잣치기, 쥐불놀이, 볼펜깍지 개구리, 동그란 종이 딱지치기(보유중이다), 레고블럭, 카프라, 펄러비즈 등 놀이를 좋아한다.
내 아이들 또한 그냥 즐기길 바랐고 놀이(혹은 일)는 자기가 노는 것임을 알기를 바랐기에 거대하고 큰 카프라성과 각종 도시들, 큰 블럭으로 만든 동물세상, 우주선, 선박을 만들면서 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아내는 165에 52 이다. 아니어도 좋다. 큰 키에 지적인 외모, 긴 머리칼에 반듯한 태도가 예의와 원칙을 중시한다. 나와는 달리, 자유분방함 보다는 엄격함과 지키기를 즐겨하고 우린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운다.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건 아내다. 바람처럼 자유분방함을 토대로 살아가는 나나 태어난 남아들을 자기 눈높이에서 보려니 허술하고 틈이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나 보다. 결코 완벽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는 언행은 빈틈 메우기에 열심이다.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우면서 타의적이다. 이야기를 즐겨하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20년이 넘어서도 내 말을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건 저 애들이 당신을 닮아서라구 자주 핀잔을 준다. 처음 만났을 때 사슴 눈망울 처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면서 키가 훤칠한 이지적인 외모, 보기좋은 몸매, 살짝 어리숙함이 반가웠다.
셋째아를 유산했을 때 하염없이 울었다. 이는 첫째아가 태어났을 때와 둘째아가 태어났을 때와는 달랐다.
최근 아빠가 운 걸 손에 꼽던데 이 날은 놓쳤나 보다. 아마 내가 숨겼나 보다.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이 훈훈하다. 가슴 가득 "우리 여행 갈까?" 했더니 "글쎄. 매일 같이 당신과 여행가면 즐거울까?"로 화답하더라. 그 다음부터 걱정 반 고민 반을 섞어서 홀로서기를 생각해야만 했고 구구절절한 가족애에 대해 구체화 해야 했다.
아이들은 맹랑하고 활기가 있으면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웅크린 곰처럼 날렵한 치타 처럼 산다.
어느 새 나 보다 더 멋진 생각과 현실을 보는 큰 아이, 말 솜씨는 정말.. 정말 타고났다.
부드럽고 여유로움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너그러움과 이타심을 타고난 둘째 아이, 마음 씀씀이가 훌륭하다.
아빠 이제 놀아야죠? 하는 멈출줄 모르는 활력소, 맹렬한 에너자이저, 하고 또 하고, 잠자리에 들 땐 아빠엄마 물을 따로 챙겨주는 따스하고 밝은 세째 아이, 이놈 미래가 궁금하다.

가족이 모이면 따스하고 훈훈하다. 특히, 처남들이 그러하다. 한결같이 말랐지만 넉넉하고 웃음짓는 모습이 멋지다.
쉬이 표현하진 못해도 다들 마찬가지라고 본다.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그렇지 뭐.. 가끔 혹은 종종 삐지다가도 가족만 한 게 없다는 걸 잘 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을 조금 놓아도 되겠구나! 했던 그날, 장남이라는 무게를 조금 덜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잘 하는 동생들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김성호.

'일기 > 엄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머니 생신축하 식사자리 (0) | 2022.06.14 |
|---|---|
| 어머니 마음 (0) | 2021.12.31 |
| 어머니 아들딸 6남매가 어느새 25명이 되었네 (0) | 2019.06.16 |
| 어머니와 아들 (0) | 2016.03.22 |
| 어머니 생신 축하 무주 여행길 - 2. 적성산 사고 (0) | 2015.07.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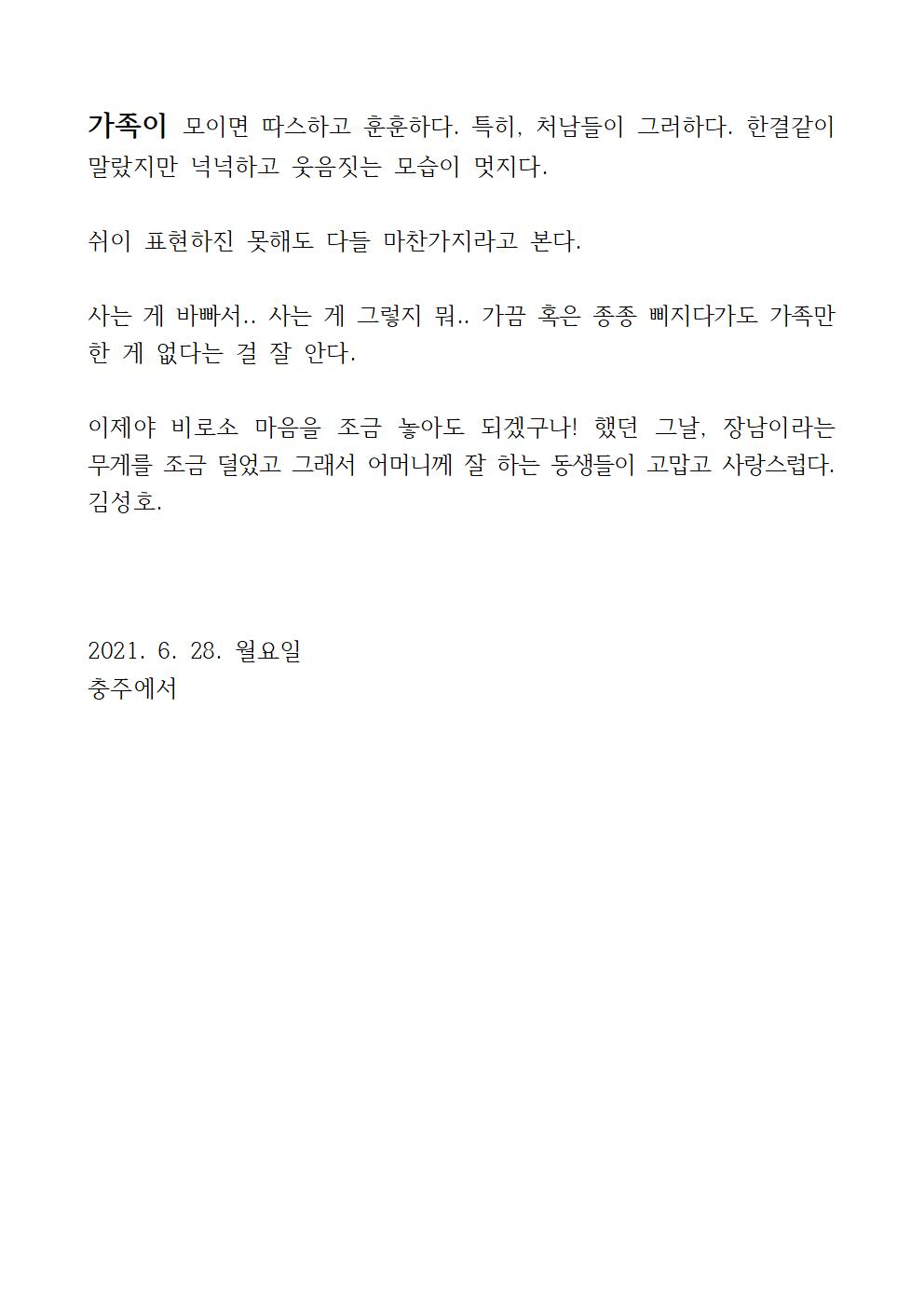


댓글